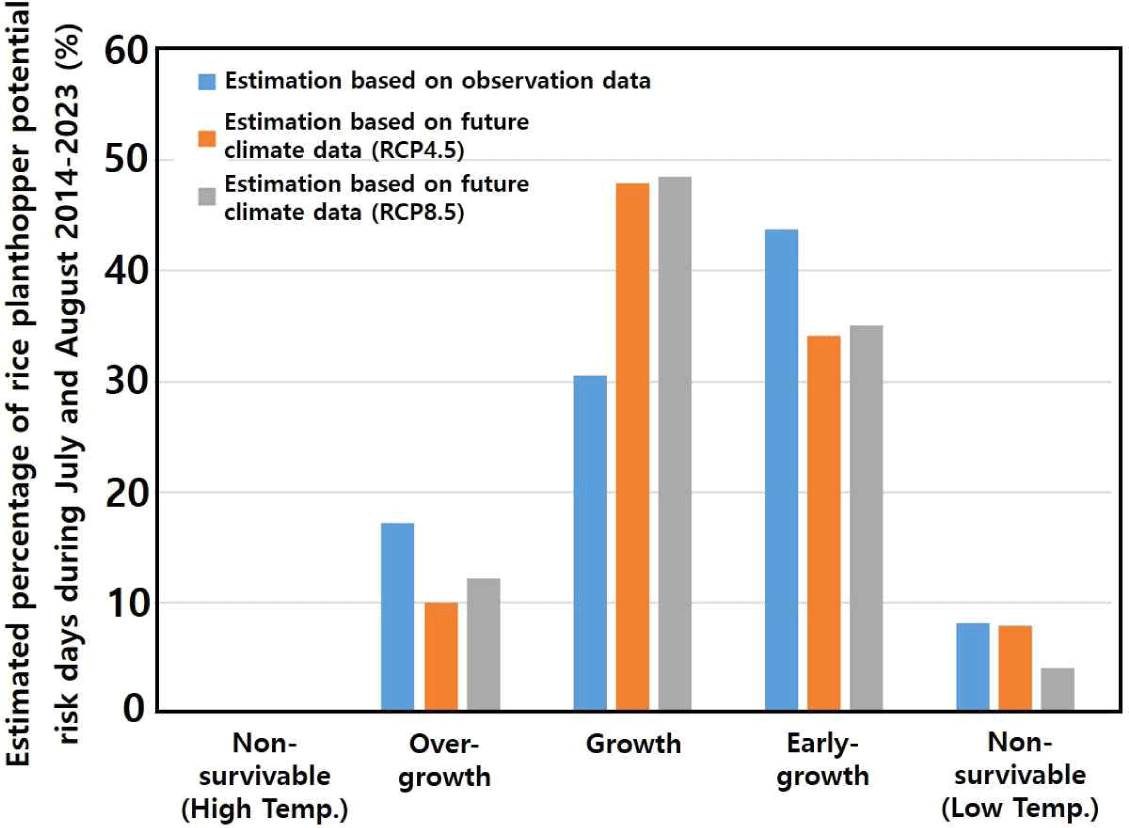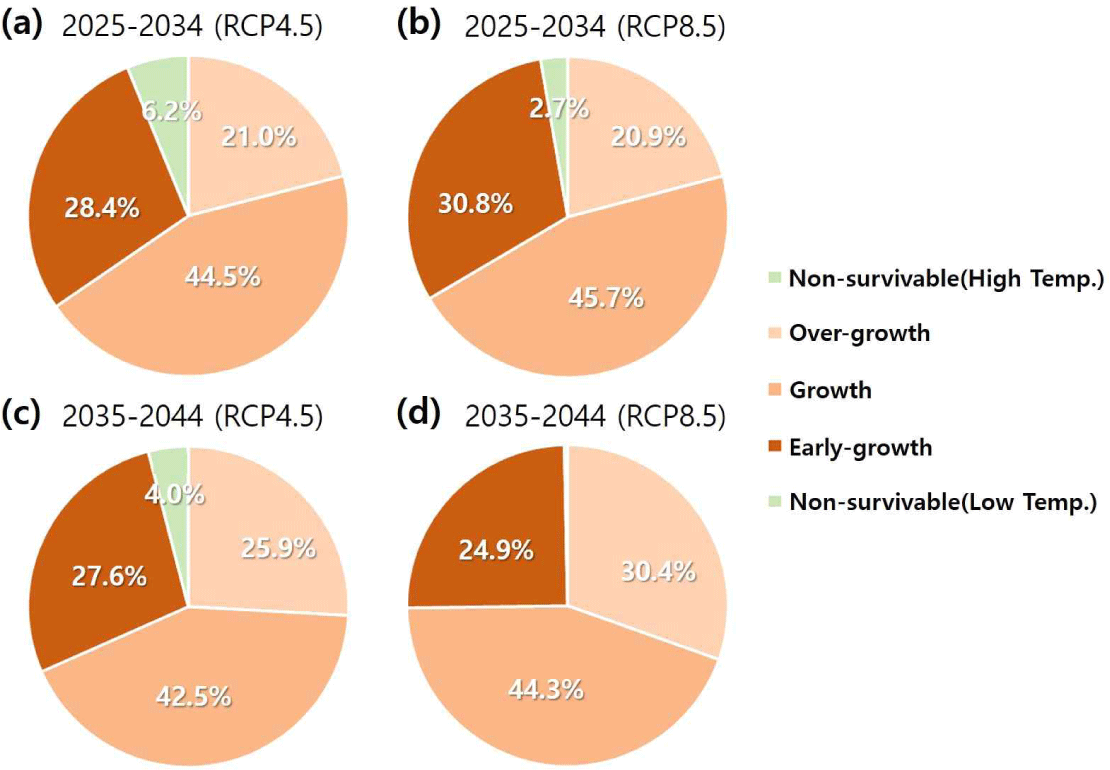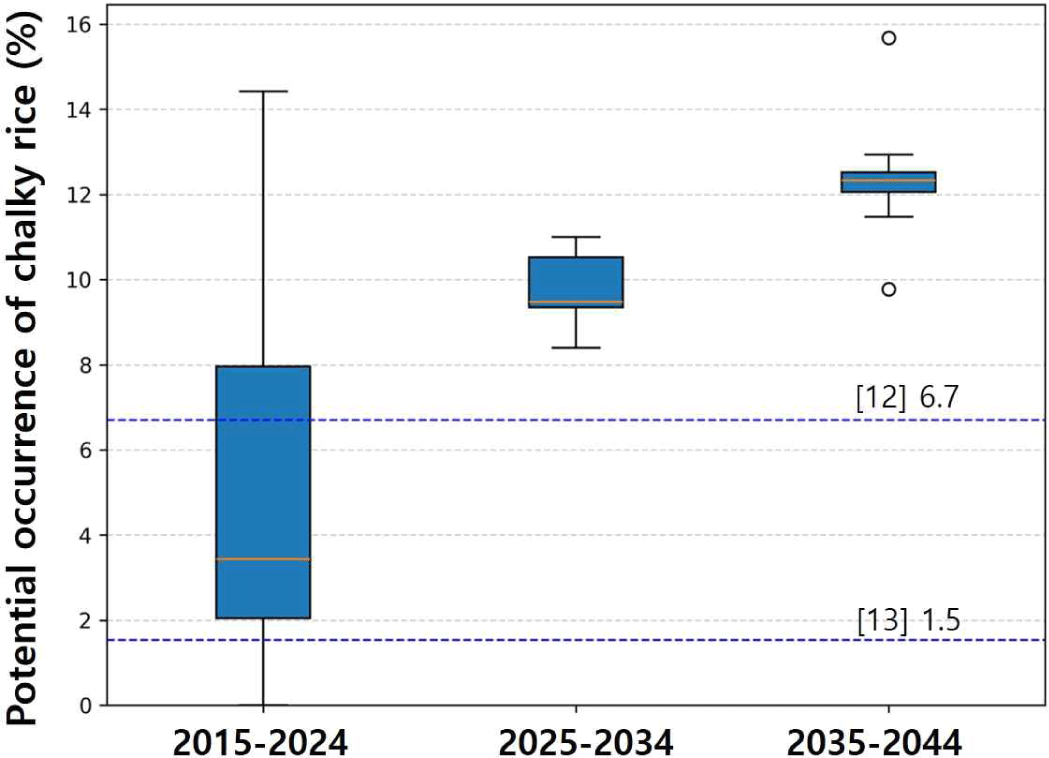ARTICLE
온난화가 해남의 미래 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벼멸구와 분상질립 발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on Future Rice Production in Haenam: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ice Planthoppers and Chalky Rice
Yedam Jeon1
,
Subin Choi1
,
Jaeil Cho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1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 Jaeil Cho, 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Tel : +82-62-530-2056, E-mail :
chojaeil@jun.ac.kr
© Copyright 2024,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05, 2024 ; Revised: Dec 19, 2024 ; Accepted: Dec 23, 2024
Published Online: Dec 31, 2024
Abstract
Haenam-kun, a major rice-producing region, is also experiencing rapid warming, and in the near future (2025–2034 and 2035–2044), the potential risk of rice planthopper damage and the occurrence rate of chalky rice were predicted. The potential risk of rice planthopper damage shows an increasing threat due to the warming climate, with stronger damage warnings predic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warming trends and pesticide resistance in China, the origin of rice planthopper outbreaks. The occurrence of chalky ric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sharply in the future, sugges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rice varieties and cultivation methods.
Keywords: rice planthopper; chalky rice; warming; Haenam-kun
서 론
온도는 작물생리 및 병해충과 같은 작물 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농업환경 요소이다[1]. 하지만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시작된 이후, 대량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도 변화는 주로 노지에서 이루어지는 식량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주요 식량작물인 벼는 비록 아열대 식물이지만, 온난화에 잠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3]. 예를 들어, 고온에서 벼꽃 수정이 안되면 쭉정이가 증가해 벼 생산량이 급락할 수 있으며[4], 벼 등숙기의 고온환경은 백미 표면이 불투명해지는 분상질립(chalky rice)을 발생시켜 쌀 품위(class)를 떨어뜨린다[5]. 또한, 온난화는 잡초의 발생시기를 빨라지게 하고 상대적으로 작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여 잡초 경합력이 떨어질 수 있다[6]. 고온환경으로 벼의 병해충 발생도 증가할 수 있는데[7], 특히 현재 익숙하지 않은 병해충의 발생은 더 큰 위험(risk)을 야기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엘리뇨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는 평년보다 긴 건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만 해도 벼 수확량이 약 11.5% 감소하는 등 쌀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쌀 수출량 1위의 인도에서도 가뭄과 집중호우의 연속된 이상기상 재해로 벼 수확량이 급감하여 인도식품협회가 발표한 쌀 가격은 11% 증가(2023년 7월 기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인도는 쌀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식량 문제는 더 크게 위협받았다. 다음 해인 2024년까지도 인도네시아 식량조달청는 쌀 수급 및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 수입량 연말까지 약 90만 톤(t)을 추가 수입할 계획(2024년 9월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한편, 고품질 쌀 생산기술로 유명한 일본도 2023년 이상고온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 쌀 생산량이 약 1.3% 감소하였다. 하지만, 생산량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2023년 9월 기준)에 따르면 1등급 쌀이 평년 70%–80% 수준에서 2023년에는 약 59.6%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1등급이 주로 주식용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다음 해인 2024년에 쌀 품귀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과거 일본은 2010년에도 이상고온으로 1등급 쌀 비율이 폭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농림수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전국 1등급 쌀 비율이 약 62.0%로 낮아졌었다. 식미가 좋기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 벼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특히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8], 2010년 쌀 생산 문제를 경험한 이후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각 지역의 보급지도센터는 고온적응 개량품종을 권장했으며, 고온에 따른 쌀 품질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와 토양관리 기술을 보급했었다. 예를 들어,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일본에서 제일 넓은 니가타현은 2023년 이상고온일 때, 지역 주재배 품종의 1등급 쌀 비율이 평년(2018–2022년 평균 기준) 대비 약 71% 감소한데 비해, 고온적응 품종은 26%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근미래의 농업 온난화 영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최근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레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응(adaptation) 노력과 위험 경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전국 최대(2015년 기준)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 해남군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9], 해남군의 미래 온난화 영향에 따른 벼 생산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해남군의 농업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정책에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2024년 9월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 해남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해남 농협은 2024년 이상고온으로 저하된 벼 품위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등외등급’을 신설하여 벼를 수매하였다. 또한, 벼 포기 아랫부분에서 집단 서식하면서 수액을 빨아먹어 벼 생육을 저해하거나 말라죽게 만드는 벼멸구는 주로 1970−80년대에 발생했으나, 2024년 9월의 이례적인 초가을 고온과 함께 대규모로 발생하여 농업재해 지역으로 관리받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해남 벼 재배의 온난화 취약성을 평가하고자 미래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근미래 분상질립과 벼멸구 발생 잠재성을 예측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기후자료
본 연구는 13개 기후모델(genenal circulation model, GCM; CanESM2, CESM1-BGC, CMCC-CM, CMCC-CMS, CNRM-CM5, GFDL-ESM2G, HadGEM2-AO, HadGEM2-ES, INMCM4, IPSL-CM5A-LR, IPSL-CM5A-MR, MRI-CGCM3, NorESM1-M)의 해남 지역 일평균기온 예측자료를 RCP 4.5와 RCP 8.5로 각각 앙상블 평균하였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 시나리오로써 4.5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의미 있게 실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8.5는 저감 없이 현재의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나리오이다. 해당 미래기후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ter resource management infromation system, WAMIS; http://wami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해남의 미래기후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2035년부터 2044년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거는 미래기후자료와 기상청의 해남 기상대 관측 자료를 서로 비교하였다.
2. 벼멸구 위험 등급
벼멸구는 월동하지 못하는 열대성 해충이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어 온도환경에 따라 발생 유무 및 강도가 결정된다[10].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벼멸구의 잠재적 위혐등급이 없었으므로, 온도에 따른 벼멸구 생리활성에 근거하여 5등급(1: 벼멸구 생육불가[고온](Non-survivable[High temp.]), 2: 벼멸구 번무(Over-growth), 3: 벼멸구 발육(Growth), 4: 벼멸구 초기(Early-growth), 5: 벼멸구 생육불가[저온](Non-survivable[Low temp.])으로 구분하였다. 20도는 벼멸구 최저한계생육온도이므로 그 이하는 생육불가로 정의했다. 25도는 가장 높은 부화율을 갖기 때문에 20–25도를 벼멸구 초기로 두었다. 27.5도는 벼멸구 최대발육속도를 보이므로 25–27.5도를 벼멸구 발육으로 보았다. 35도는 벼멸구 최고한계생육온도이기 때문에 27.5–35도를 벼멸구 번무로 두었고, 35도 이상은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생장불가 구간으로 정의했다. 미래기후자료는 RCP4.5와 8.5를 적용하였다.
3. 분상질립과 기온
우리나라 통계청 및 지자체에서는 쌀 품위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기온과 분상질립 발생 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선행연구[11]에서는 일본내 4개 사이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벼 출수 후 20일 동안의 기온 평균과 분상질립 발생 비율이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11]의 경험식을 이용하였으며, 해남에서 벼 출수일은 8월 15일로 가정하였다. 미래기후자료는 RCP8.5를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벼멸구 잠재 위험 예측
Fig. 1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거에 대해 7, 8월의 벼멸구 잠재 위험일수의 비율(%)을 기상청 해남 기상관측소의 관측 기온과 미래기후데이터(RCP4.5 & 8.5)의 추정 기온을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발육’ 단계에서는 미래기후데이터 결과가 과소평가되었으며, ‘초기’와 ‘번무’ 단계에서는 과대평가를 보였다. Fig. 2에서 보인 RCP4.5 시나리오의 2025–2034년에는 6–9월 동안 ‘초기’가 28.4%, ‘발육’이 44.5%, ‘번무’가 21.0%를 보였다. 이는 RCP8.5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단지 ‘초기’와 ‘번무’가 다소 증가하고, ‘번무’가 감소했다. 2035–2044년의 RCP4.5 시나리오에 따르면, ‘초기’가 27.6%, ‘발육’이 42.5%로 2025–2034년보다 감소했지만, ‘번무’는 25.9%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RCP8.5에서 더 뚜렷하게 보였는데, ‘번무’가 2025–2034년에 비해 2035–2044년에는 9.5% 증가했다. 물론, 잠재 위험성이 반드시 실제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남은 미래에 온난화되어가는 기후로 인해 점차 벼멸구 피해 위험이 강한 강도(‘번무’)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 사용된 미래기후시나리오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이상기상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써, 온난화될수록 극한폭염이 빈번해질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실제 피해는 더 클수도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벼멸구의 근원지인 중국의 온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중국에서 사용하는 농약 종류와 농도에 따라 내성을 갖는 벼멸구가 유입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ig. 1.
Estimation of potential rice planthopper risk day ratio (%) from July to August 2014 to 2023 based o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observed air temperatures (blue), and future climate data under the RCP4.5 (orange) and RCP8.5 (gray) scenarios.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Download Original Figure
Fig. 2.
Estimation of potential rice planthopper risk day ratio (%) during the rice growing season (June to September) from 2025 to 2034 (a,b) and from 2035 to 2044 (c,d) under future climate scenarios RCP 4.5 (a,c) and RCP 8.5 (b,d).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Download Original Figure
2. 벼의 분상질립 비율 예측
Fig. 3은 벼에서의 분상질립 비율을 예측한 결과이다. 과거 2015–2024년의 기상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분상질립을 예측한 결과는 폭이 넓은 범위(상위/하위 25% 이상/이하 제외: 약 2%에서 8%)로 나타났다. 이는 2018, 2024년 등 최근 빈빈히 일어난 폭염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Kim et al.[12]이 조사한 2006–2007년의 경상북도 브랜드 쌀 26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평균 약 6.7%의 분상질립을 보였다. An et al.[13]은 2008–2013년 전라남도 10대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 1.5%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역과 년도에 따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기후데이터로 추정된 분상질립 비율은 2025–2034년에는 약 9.2%, 2035–2044년에는 약 1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부 고시 쌀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분상질립의 최고한도(%)는 ‘보통’이 10%, ‘상’이 6%, ‘특’이 2%인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쌀 품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남의 대표 브렌드 쌀인 ‘한눈에반한쌀’은 일본 히토메보레 계통 품종으로 고온에 비교적 강한 편이나 향후 고온적응성 벼 품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분상질립 추정 경험식이 일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근 미래에는 온난화와 함께 분상질립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Fig. 3.
Estimation of the chalky rice occurrence ratio (%) using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observed air temperature data from 2015 to 2024, and future climate data under the RCP8.5 scenario for the periods 2025–2034 and 2035–2044.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Download Original Figure
요 약
해남군은 주요 쌀 생산지이자 우리나라에서 온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중인 지역으로 근미래인 2025–2034년과 2035–2044년의 벼멸구 잠재 위험성과 벼의 분상질립 발생 비율을 예측하였다. 벼멸구 잠재 위험성은 온난화되어가는 기후로 인해 점차 강한 피해 위험 경고를 미래 예측으로 보여준다. 향후 벼멸구의 발생지인 중국의 온난화 및 농약 내성 등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벼의 분상질립 또한 미래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벼 품종 및 재배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자료처리에 도움을 주신 전남대 기후작물생리학 연구실의 조윤아, 전남농업기술원의 민현경 농업연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References
Smit B, Ludlow L, Brklacich M. Implications of a global climatic warming for agriculture: a review and appraisal. J Environ Qual. 1988;17:519-527. .


Kim BJ. Global climate change status and agricultural sector challenges. Naju, Koer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 (KREI), 2012. vol. 146, p. 1-29.

Shim KM, Roh KA, So KH, Kim GY, Jeong HC, Lee DB. Assessing impacts of global warming on rice growth and production in Korea. J Climate Change Res. 2010;1: 121-131.

Oh D, Ryu JH, Jeong H, Moon HD, Kim H, Jo E, et al. Effect of elevated air temperature on the growth and yield of paddy rice. Agronomy. 2023;13:2887. .


Masutomi Y, Takimoto T, Shimamura M, Manabe T, Arakawa M, Shibota N, et al. Rice grain quality degradation and economic loss due to global warming in Japan. Environ Res Commun. 2019;1:121003. .


Korres NE, Norsworthy JK, Tehranchian P, Gitsopoulos TK, Loka DA, Oosterhuis DM, et al. Cultivars to face climate change effects on crops and weeds: a review. Agron Sustain Dev. 2016;36:1-22. .


Kim KH, Cho J, Lee YH. Forecasting brown planthopper infestation in Korea using statistical models based on climatic tele-connections. Korean J Appl Entomol. 2016;55:139-148. .


Kobayashi A, Machida Y, Watanabe, S, Morozumi Y, Nakaoka F, Hayashi T, et al. Effects of temperature during ripening on amylopectin chain-length distribution of ‘Koshihikari’and ‘Ichihomare’. Plant Prod Sci. 2022;25:250-259. .


Jung J, Kim IG, Lee DG, Shin J, Kim BJ. Study on the vulnerability regarding high temperature related mortality in Korea. J Korean Geogr Soc. 2014;49:245-263.

Song Y, Lee JH, 2007. Studies on the prediction models for the outbreaks of the long range migratory planthoppers on rice. Jeonju, Koer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 90.

Masutomi Y, Arakawa M, Minoda T, Yonekura T, Shimada T. Critical air temperature and sensitivity of the incidence of chalky rice kernels for the rice cultivar “Sai-no-kagayaki”. Agric For Meteorol. 2015;203:11-16. .


Kim SJ, Ahn DJ, Won JG, Park, SD, Choi CD. Analysis of grain quality of commercial brand rice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rices in Gyeongbuk province, Korea. Korean J Crop Sci. 2008;53:44-46.

An KN, Lee I, Shin SH, Min HK, Kwon OD, Park HG, et al. Characterization of seasonal and annual variations in quality of rice brands distributed in Jeonnam province. Korean J Crop Sci. 2017;62:79-86. .